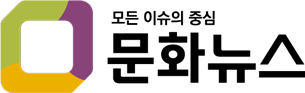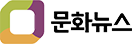국립현대미술관 청주에서 11월 21일 까지 개최
13명 작가 신작 포함, 87점 작품 선보여
[문화뉴스 박준아 기자] 국립현대미술관이 인간과 자연의 관계와 경계의 문제를 살펴보는 기획전 ‘미술원, 우리와 우리 사이 (ARTificial Garden, The Border Between Us)’를 7월 13일(화)부터 11월 21일(일)까지 국립현대미술관 청주에서 개최한다.

《미술원, 우리와 우리 사이》는 전 세계적 감염병 대유행 속에 인간 중심의 사고방식으로 자연을 바라보던 기존의 관점에 대해 질문하고 공존을 모색하는 전시다.
‘미술원’이라는 전시 제목은 미술관과 동물원, 식물원이 비슷한 방식으로 대상을 수집하며, 보호와 보존이라는 공통의 목적이 있음에 착안해 만든 합성어다.
전시에 앞서 윤관모 국립현대미술관 관장은 “코로나19 바이러스 또한 인간의 자연 파괴와 관계가 있는 만큼 인간과 자연과 새로운 관계에 관한 생각의 계기가 되는 전시가 되길 바란다”고 전했다.
전시 제목의‘우리’란 말은 한국 정서의 독특한 단어로, 친숙하게 일상에서 많이 사용하는 단어지만 반대로 우리가 아닌 자들을 만들어 배타성을 갖는다. 동음이의어 울타리, 동물을 가두는 ‘우리’란 말과도 연결되는 언어의 중의적 성격에 주목 우리(cage)로서 우리(we)를 만들고 해체하는 작업을 시각화해 사람 사이의 관계뿐 아니라 동·식물을 포함한 ‘우리’의 관계를 모색했다.
전시는 ‘#1 우리와 우리 사이’, ‘#2 어색한 공존’, ‘#3 도시와 자연, 그 경계에서’, ‘#4 함께 살기 위해’라는 4개의 주제로 구성되었다. 개별적인 주제면서 동시에 이어 읽어도 크게 어색하지 않은 문장이 되는 재밌는 주제명이다. 주제 또한 나뉘고 이어지는 그 경계를 허무는 시도라고 할 수 있다.

전시는 경계와 배타성을 의미하는 ‘벽’을 최소화하고, ‘우리(cage)’철창 등 구조물을 이용해 공간을 구성했다. 그리고 여러 작가의 작품을 구획을 나누지 않고 한 공간에서 작품과 작품이 상호 영향을 주고받는 관계에 있음을 보여줌으로써 관계와 경계의 의미를 하나의 공간에 구현하고자 했다.
전시는 ‘#1 우리와 우리 사이’는 물리적인 ‘우리(cage)'의미에 주목해 새로운 시각에서 대상을 해석한 작품들이 전시됐다. 실제 관객이 우리에 갇히는 체험을 할 수 있도록 우리를 재현한 ‘인간 우리’와 함께 동물원에서 탈출 후 사살당한 퓨마‘뽀롱이’를 담은 그림‘나는 나의 삶과 죽음을 인정할 수 없다’를 설치한 박용화 작가의 작품과 이창진 작가의 철조망으로 관객을 직접 공간에서 나누고 통제하는 작품‘철조망’ 등이 있다.
‘#2 어색한 공존’은 서로 다른 종인 인간과 동물의 가까워진 거리에 대해 살펴보며 이들의 자연스러운 공존의 방식은 무엇인지 질문한다.

금혜원 작가의 박제화된 반려동물의 사진, 장례식 풍경 등 반려동물의 장례 문화들을 모은 작품은 막연한 불편함을 관객들에게 준다. 사물화된 반려동물들을 통해 작가는 그들의 삶과 죽음 소유와 욕망 사이의 관계를 들여다보는 계기를 만든다. 박제된 반려동물들과 그들이 남긴 유품, 호화로운 장례식은 누구를 위한 것일까?
세 번째 주제‘#3 도시와 자연, 그 경계에서’는 도시환경에 길들여진 자연의 의미를 묻는다. 재개발로 인해 버려진 유기견, 아파트 건설로 파헤쳐져 방치된 땅에서 자라난 식물 등 자연과 인공 사이, 경계에서의 삶을 생각해 볼 수 있다.

회화 작품 외에도 기자의 눈길을 끈 것은 김라연 작가의 미디어 작품이었다. 새로운 생태를 이루고 살던 식물들의 이름을 찾아주고 그 식물들의 학명을 공 모양으로 새겨 물감을 묻혀 굴리면서 글자들이 종이에 흔적을 남기는 작업이었다.
천천히, 고유의 속도로 살아가던 식물들이 다시 재개발이 진행됨에 따라 사라지게 되는 속도, 혹은 이름을 부르는 말소리가 일시적으로 나타났다 사라지는 특성을 굴려서 흔적을 남긴다는 행위로 치환한 것. 식물이 살아가는 속도와 사라지는 속도의 대비가 확연히 느껴졌다.
마지막 ‘#4 함께 살기 위해’는 인간과 동식물, 자연이 함께 살기 위해 무엇이 필요한지 질문해 볼 수 있는 공간이다.
전시 기간, 자라는 식물들도 관전의 또 다른 포인트

송성진 작가는 살아있는 생명이 아닌 고기로서 다뤄지는 돼지들에 대해 반문한다. 구제역 발생 당시 살처분된 돼지들을 기리며 그 지역 흙으로 돼지의 형상을 빚어 거기에 풀(생명)을 싹을 틔워 제의적 의미를 담은 것.

식물전문가인 본인의 특성을 살린 김이박 작가의 설치 작품들도 흥미로웠다. 특히, 화분에 오래된 사물들을 심어 생명을 부여한 ‘사물의 정원_청주’ 작품이 이창진 작가의 죽은 화분의 식물들을 수평으로 나열해 제시한 작품‘죽은 식물’과 대조되어 눈길을 끌었다.

화분은 소비되는 식물들의 죽음의 공간임과 동시에‘사물의 정원’에서는 사물들이 생명을 얻게 되는 공간이다. 이 또한 관계에 따라 죽음과 생명이 대상의 경계가 흐려지는 전시의 연장 선상이 아닐까.
전시를 보는 동안 관계와 경계에 대한 의미를 생각하며 전시공간 속에 있으면 내가 서 있는 위치도 불분명해져 발이 붕 뜨면서 마치 무중력 속에서 전시를 관조하는 이상한 기분이 들었다.
‘우리와 우리 사이’는 1년을 준비한 탄탄한 기획으로 금혜원, 김라연, 김이박, 박지혜, 박용화, 송성진, 이창진, 정재경, 한석현 작가와 국립현대미술관 소장품 작가 김미루, 정찬영, 미술은행 소장품 작가 이소연, 최수앙 등 총 13명 작가의 신작 3점을 포함한 다양한 매체의 작품 87점을 선보인다.
11월 21까지 열리는 이번 전시는 시간이 지남에 따라 식물이 자라는 과정을 지켜보는 등 더욱 의미를 갖게 되는 작품들도 여럿 있어, 일회성으로 그치는 전시가 아니기 때문에 많은 관객이 꾸준히 즐겨주길 기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