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울’은 나를 볼 수 있는 매개체
19가지 시선으로 보는 자아의 상(像)

[문화뉴스 김창일 기자] 사람의 눈에는 가위가 있나 봅니다. 내 맘대로 상대방을 오리고 붙여 그 사람의 상(像)을 만듭니다. 내가 만든 허상(虛像)을 진짜라고 믿고 그 사람에 대해 정의를 내립니다. 때론 나 스스로를 재단할 때도 있습니다. 거울 속, 좌우가 바뀐 모습을 보고 ‘나’라고 믿고, 나를 재단하기 시작합니다. 허상으로 만들어 낸 ‘나’를 가지고 세상으로 나갑니다. 결국 ‘타자’도 ‘나’도 내가 만든 허상일 뿐입니다.
석파정 서울미술관에서 전시 중인 ‘거울 속의 거울’展에 다녀왔습니다. 19팀의 100여점의 작품을 통해 19개의 테마로 ‘나’에 대해 질문하고 있습니다. 전시회를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장수지 작가는 사람에게 가장 아름다운 시절인 소년, 소녀의 시간을 담았습니다. 꿈과 이상을 펼치고 싶었고, 무엇보다 가장 순수했던 시절을 표현했습니다. 하지만 청춘은 내일에 대한 불안감도 상존하는 시간입니다. 작가는 불안한 청춘의 시간을 눈동자로 그려냈습니다. 그리곤 묻습니다. ‘당신의 ‘불안’은 무엇입니까?’라고.

연여인은 무의식을 투영하는 거울인 꿈을 표현했습니다. 멀리서 보면 몽환적이고 기억의 파편을 펼쳐진 것처럼 보입니다. 시간의 조각조각을 모아 놓고, 하나의 시간에 응축시킨 것 같다는 느낌도 받습니다. 일부분의 시간처럼 그림을 한 부분씩 보면 전체의 작품과는 다른 이미지가 연상됩니다.
매일 차를 타고 다니던 길, 문득 졸다가 깼을 때 ‘여긴 어디지?’라고 당황한 적이 있었습니다. 내가 기억한다고 생각했던 길은 연속선상이지 특정의 한 부분이 아니었습니다. 연여인 작가의 그림을 보고 있으니 ‘나의 기억이 파편화된다면 내가 알고 있는 것이 정말 내 기억일까?’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채은 작가의 작품들은 여러 거울이 겹쳐져 서로를 복제하는 것처럼 같은 상을 다르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같은 상이라도 프레임이 달라지면 다르게 보이게 됩니다. 우리도 그렇습니다. 같은 ‘나’이지만 공간과 시간에 따라 다른 모습을 보입니다. 겉으로 보여지는 ‘나’는 굴절된 ‘나’이지만 타자들에겐 보편적 개인일 뿐입니다.

요즘은 인증샷의 시대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행, 맛집, 일상 등을 찍어 기쁨, 행복, 우울, 아쉬움등을 해쉬태그(#)를 붙어 SNS에 업로드합니다. 마치 자신의 감정을 업로드하는 것처럼요. 한 순간을 기록한 사진은 좌우가 바뀐 거울과 같습니다. SNS에 올린 나의 거울을 보고 ‘좋아요’를 바라는 건, 나를 오해해서 감사하다는 의미일까요?

마지막 거울은 티벳 아이들의 얼굴을 담고 있습니다. 맑은 밤하늘의 별처럼 빛나는 눈동자를 한 아이들은 마음을 꿰뚫어 보는 듯한 심미안을 갖고 있습니다. 눈동자를 보고 있으면 나의 마음도 정화화는 듯한 느낌을 받게 됩니다.

거울 속의 거울’전을 관람하셨다면 한 층을 이동해 운보 김기창 청록산수 전, 신사임당 특별전, 별관 M2관의 이중섭 판화전도 즐겨보세요. 전시 입장권을 구입한 달에는 횟수 제한없이 관람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서울미술관에서만 느낄 수 있는 석파정도 꼭 관람해보세요. 사시사철 다른 매력으로 관람객에게 서울의 자연을 선물하고 있습니다. 너럭바위까지 다가가면 차소리를 들리지 않고 새소리만 들리는 마법을 보여주기도 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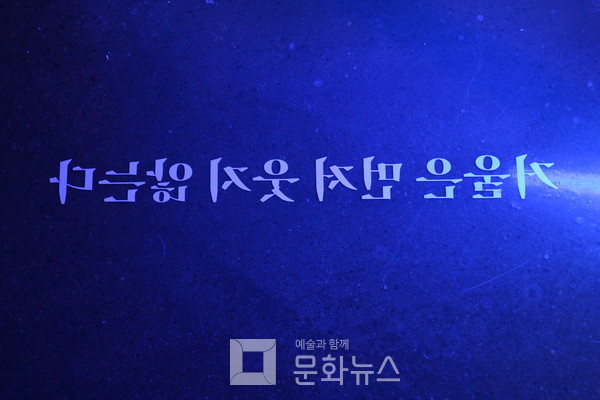
라깡은 “인간은 타자의 욕망을 욕망한다.”고 했습니다. 현대사회는 욕망도 내 것이 아닌 복제되고인정된 욕망을 추구합니다. 거울 속의 ‘나’에서 벗어나야 할 때가 아닐까요? 전시를 통해 진정한 ‘나’의 모습을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