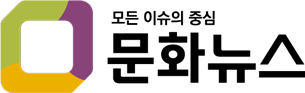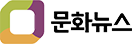삼계탕부터 치킨까지 진화한 여름 보양 풍속
몸도 마음도 잠시 엎드리는 시간…계절의례로써 복날의 현재와 의미

(문화뉴스 이건희 기자) 무더위가 본격화되는 7월 중순, 올해도 어김없이 복날이 찾아온다.
2025년 초복은 7월 20일로, 중복은 7월 30일, 말복은 8월 9일이다. 복날은 단지 보양식을 먹는 여름철 관습으로 알려져 있지만, 그 유래와 의미는 훨씬 더 깊다.
초복을 앞두고, 복날의 어원과 구조, 그리고 그 안에 담긴 옛사람들의 계절 철학을 짚어본다.

◼ ‘엎드릴 복(伏)’에서 시작된 더위의 시간표
복날(伏日)의 ‘복(伏)’은 엎드릴 복 자로, 한자 구성상 사람 인(人)과 개 견(犬)이 합쳐진 형태다. 이는 가장 더운 시기에 사람과 개가 나란히 엎드려 더위를 피하는 모습을 상징한다고 전해진다.
‘삼복(三伏)’은 하지(夏至) 이후 첫 번째 경일(庚日, 십간 중 일곱 번째 글자로 10일 주기로 반복되는 날)에 해당하는 초복(初伏), 네 번째 경일인 중복(中伏), 입추(立秋) 후 첫 경일에 해당하는 말복(末伏)으로 구성된다.
십간의 순환 원리로 인해 복날은 기본적으로 10일 간격으로 찾아오며, 이 간격이 일정할 경우를 ‘매복(每伏)’, 중복과 말복 사이가 20일 간격일 경우를 ‘월복(越伏)’이라 한다.
올해는 10일 간격의 매복이다.

◼ 복날의 기원과 농경 사회의 논리
복날의 기원은 기원전 7세기, 진(秦)나라 덕공 시기로 거슬러 올라간다. 『사기(史記)』에 따르면 이 시기에 복날이 처음 제정되었으며, 열독(熱毒)을 다스리기 위해 개고기를 먹었다고 한다.
우리나라에서는 예부터 복날을 일 년 중 가장 더운 시기로 인식하고, 고열량의 고기 요리나 국물 음식을 통해 기력을 보충하려는 관습이 정착되었다. 이는 바로 ‘이열치열(以熱治熱)’의 전통적 사고방식과도 맞닿아 있다.
농경 사회에서는 더위와 맞서면서도 생업을 지속해야 했다. 한낮 노동은 어렵고, 밤 작업은 호환의 위험이 컸기에, 체력을 보완하는 음식이 필수였다. 복날을 기준으로 벼가 마디를 하나씩 더해간다는 민속적 인식 또한 농경의 리듬과 깊이 연결돼 있다.

◼ 보양식부터 탁족까지, 여름나기의 풍경
복날 하면 떠오르는 대표 음식은 시대에 따라 달라졌다. 과거에는 보신탕(개장국)이 보편적이었으나, 개고기 소비에 대한 인식 변화와 함께 삼계탕, 닭백숙 등이 대중화되었다.
민어, 장어, 추어탕, 육개장, 흑염소 요리, 전복죽 등 다양한 고단백 보양식도 즐겨 찾는다. 반면 젊은 세대를 중심으로는 초계탕, 냉면, 콩국수 등 차가운 음식을 선호하는 경향도 뚜렷하다.
식문화 외에도 다양한 풍속이 복날에 얽혀 있다. 아이들과 아낙들은 참외와 수박을 먹으며 더위를 달래고, 어른들은 계곡에 들어가 발을 씻는 ‘탁족(濯足)’으로 한여름을 견딘다.
해안 지역에서는 백사장에서 모래찜질을 하며 더위를 이겨냈다. 복날 목욕에 얽힌 속신도 흥미롭다. 이날 목욕을 하면 몸이 여위게 된다고 믿어 피했고, 만약 초복에 목욕을 했으면 중복과 말복에도 반드시 해야 한다는 믿음도 있었다.
또한 “복날에 비가 오면 청산·보은의 큰애기가 운다”는 속담도 있다. 충북 청산과 보은은 대추 생산지로, 복날마다 맑은 날씨가 이어져야 대추가 잘 열매 맺는다는 믿음에서 비롯된 말이다. 복날의 날씨조차 민생과 긴밀히 연결돼 있던 셈이다.

◼ 한국만의 풍속일까? 동아시아의 ‘더위 의례’
복날은 한국만의 계절풍속이 아니다. 일본에는 ‘도요노우시노히(土用の丑の日)’라는 유사한 전통이 있다. 이는 입추 전 18일 중 십이지 간지에서 ‘소(丑)’일에 해당하며, 이때 장어를 먹는 풍습이 있다.
에도시대부터 널리 퍼졌고, 여름철 기력을 보충하는 음식으로 장어가 자리 잡게 됐다. 특히 ‘우시노히(丑の日)’라는 말에 착안해 우동, 우메보시 등 ‘우’로 시작하는 음식을 먹는 풍습도 생겼다.
중국에도 삼복절(三伏節)이라 하여 복날을 기념하며, 이 시기에는 고온다습한 날씨로부터 몸을 보호하기 위해 한약재를 넣은 국물 요리나 약찜을 먹는 문화가 있다.
노약자의 외출을 삼가고, 일정한 날짜에 건강식을 챙겨 먹으며 여름을 이겨내는 관습은 동아시아 전역에 공통적으로 나타난다. 절기와 생리적 리듬을 함께 읽고자 했던 전통은 국경을 넘어 닮아 있다.

◼ 계절의례로서의 복날, 그 지혜를 기억하다
오늘날 냉방시설의 보급과 영양 섭취의 다양화로 복날 음식의 실용성은 줄었지만, 복날은 여전히 여름을 상징하는 중요한 계절의례다. 사람과 자연의 리듬을 맞추며 체력과 마음가짐을 다잡던 선조들의 방식은, ‘더위 속에 잠시 엎드린다’는 복(伏)의 뜻처럼 겸허한 삶의 태도를 담고 있다.
요즘에는 복날을 맞아 삼계탕 대신 치킨을 먹거나, 카페에서 빙수를 즐기는 방식으로 여름을 기념하는 이들도 많다.
전통은 시대와 함께 변하되, 그 안에 담긴 마음가짐은 여전히 유효하다.
올여름, 복(伏)이라는 이름에 담긴 계절의 지혜를 다시 떠올려볼 때다.
문화뉴스 / 이건희 기자 press@mhn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