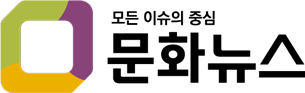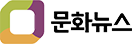광양시장 ‘행사 중심’ 동선과 시민 접촉 방식이 복지 사각지대와 민원 적체를 키운다는 지적. 휴일·새벽 ‘무(無)수행’ 현장행정으로 3선을 굳혔다는 비교가 지역 여론의 분노를 자극
(문화뉴스 이동구 기자) 광양시 곳곳에서 “축제는 넘치는데 독거노인은 물값도 못 낸다”는 푸념이 쌓인다. 시장실엔 번호표 기계가 놓이고, 시 주관 행사에선 ‘마음에 안 드는’ 인사는 소개조차 어렵다는 말이 돈다.
반면 인근 지자체의 모 군수는 새벽마다 공무원 동행 없이 현장을 뛰며 민원을 즉석 해결해 재선·3선을 잇달아 성공했다는 비교가 나온다. 광양 행정의 중심을 ‘행사’에서 ‘현장’으로 돌려놓을 때다.

광양은 요즘 주말마다 축제가 겹친다. 경제 활성화 명분은 그럴듯하지만, 삶의 바닥은 다르다. 3층 공동주택에서 앞·뒷문을 열어 더위를 버티는 독거노인, 2년 넘게 납부 못한 수도요금을 이웃 세대가 대신 내는 현실이 있다. 축제 홍보차량이 스쳐 지나간 그 골목에서, 시는 무엇을 보았나. ‘도시 이미지’는 챙겼지만 ‘사람 체온’은 놓친 건 아닌가.
문제는 접촉 방식이다. 시장실 앞 번호표는 단순한 편의장치가 아니다. 권력과 시민 사이에 생긴 ‘심리적 유리벽’이다. 시장을 만나려면 줄부터 서라—라는 무언의 메시지. 공무원은 남이 아니다. 시민과 함께 문제를 해결하는 동료다. 하지만 현장 대신 행사장에 배치되는 동안, 민원은 책상 위 메모로만 쌓인다.
비교 해보자. 경남의 어느 군수는 공무원 수행 없이 휴일·새벽 현장을 다닌다는 취지로 여러 차례 보도가 됐다. 주민이 잠든 골목, 첫차가 다니는 시간, 그때 그는 혼자 벨을 눌렀다. “무엇이 불편하십니까.” 답은 현장에서 들었고, 조치는 그 자리에서 시작됐다. 이런 리듬을 수년 이어가면 이름 앞의 ‘3선’은 선거 전략이 아니라 생활 습관의 결과가 된다. 광양의 리더십이 배워야 할 대목이다.
행사장의 ‘선별 소개’ 논란도 구설이다. 시가 주관하는 공식 무대에서 특정 인사 소개를 제한했다는 말이 돈다. 이것은공공의 장을 사적 호불호로 재단한 셈이다. 공공성은 절차에서 시작한다. 절차가 흔들리면 신뢰는 금세 무너진다.
그렇다면 무엇을 바꿀 것인가.
첫째, 현장행정의 시간대를 바꾸자. 주 2회, 새벽 5~7시 ‘무수행 현장 콜’ 표준화—시장·부시장·국장이 번갈아 직접 민원 접수 및 24시간 내 1차 조치.
둘째, 행사예산은 KPI(목표달성 수치지표)로 묶자. 축제 당일 유입·체류·지출, 지역상권 효과, 복지연계 지표를 분기별로 공개하고, 하위 성적 행사는 과감히 구조조정.
셋째, ‘번호표’를 ‘직통’으로 바꾸자. 신원 비보장 비공개민원창구(오프라인 1곳+전화 1회선) 개설, 접수→조치→사후점검 전 과정을 시민에게 문자로 통지.
넷째, 복지 사각지대의 생활형 급전을 만들자. 수도·전기 체납 위기 가구를 위한 긴급 바우처와 ‘이웃 연대 상환’ 제도를 시가 제도화해 ‘착한 연대’가 구조가 되게 하자.
다섯째, 시장 동선의 30%를 취약지역 정기 순회로 의무화하고, 매월 ‘현장행정 리포트’를 시 홈페이지에 공개하자.
시민에게도 주문한다. 시장이 서 있는 곳이 행사장인지, 민원 현장인지 확인하자. 보도자료 문장 속 ‘활성화’라는 단어가 실제 가구의 ‘생활’로 번역되는지 따져보자. 박수는 쉽지만 검증은 손이 간다. 민주주의는 그 손을 필요한 곳에 보태는 기술이다.
광양시의 리더십은 지금, 구호가 아니라 자세를 바꿔야 한다. 축제는 줄이고 현장을 늘려라. 번호표는 치우고 초인종을 눌러라. 사람 사는 냄새가 나는 행정 그게 시민이 기다린 ‘감동행정’의 본모습이다.
문화뉴스 / 이동구 기자 pcs81914@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