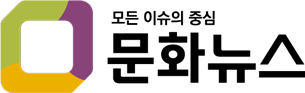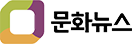무너진 소아 의료체계… “아이를 살릴 병원이 없었다”

(문화뉴스 이기철 기자) 부산 도심에서 경련 증세를 보이던 고교생이 소아과 병원을 찾지 못해 결국 숨졌다는 안타까운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다.
지난달 20일 오전 6시 17분, 부산 한 고등학교 인근에서 학생이 갑작스럽게 경련을 일으켰다. 지나가던 시민이 서둘러 119에 신고했고, 구급대는 16분 뒤 현장에 도착했다. 당시 학생은 의식이 흐려졌지만, 이름을 부르면 반응할 수 있는 상태였다고 연합뉴스가 18일 전했다.
하지만 문제는 그때부터 시작됐다. 구급대원은 학생을 이송하기 위해 부산의 대형 병원에 연락했지만 병원 네 곳이 모두 “소아 신경과 관련 진료가 불가능하다”며 수용을 거부했다.
구급 상황관리센터도 총 8곳의 병원에 추가로 연락했으나 돌아온 답은 모두 같았다. 부산에서 치료할 병원이 없자 경남 창원 지역 병원까지 수색 범위를 넓혔지만, 결과는 바뀌지 않았다.
시간만 흐르고 있었다. 구급차 안에서 약 한 시간이 지난 뒤 학생은 결국 심정지에 빠졌다. 그제야 가장 가까운 병원으로 향했고, 5분 만에 도착했지만 이미 늦었다.
생명을 살릴 골든타임이 병원 거절 속에 사라진 것이다.
부산소방재난본부 관계자는 “당시 부산 내에는 소아 신경계 배후 진료가 가능한 병원이 없었다”며 “학생을 실은 구급차가 계속 수용 가능 병원을 찾아 이동할 수밖에 없었다”고 밝혔다.
부산 도심, 그것도 아침 시간대에 한 명의 학생이 적절한 치료를 받지 못해 목숨을 잃었다는 것은 의료 현장에서 소아 진료 공백이 심각한 현실이 되었음을 보여주고 있다.
문화뉴스 / 이기철 기자 thecenpen@gma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