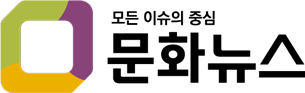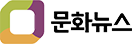연극 '글로리아' 리뷰
 | ||
[문화뉴스] 마치 하나의 사건에 대한 여러 인물들의 일상을 원테이크로 담아낸 것 같은 연극 '글로리아'. 이 극의 중심에는 글로리아가 저지른 충격적인 사건이 있다.
잡지사 교열부에서 10년을 묵묵히 일해 온 글로리아(임문희 분). 그녀의 집들이 파티에 회사 동료들은 아무도 참석하지 않고 오로지 딘(이승주 분)만 그 자리에 참석한다. 다음날 글로리아는 음산한 분위기로 동료들을 만난다. 여전히 자신을 무시하는 동료들의 태도에 화가 난 글로리아는 돌이킬 수 없는 행동을 저지르고 만다.
 | ||
여느 작품에서든 충분히 클라이막스로 여겨질 수 있는 끔찍한 사건. 그러나 '글로리아'에서 이 사건은 인간의 표상을 담아내기 위한 하나의 전제 사건이 됐다(이 사건이 어떤 사건인지 설명하는 것은, 아직 극을 보지 않은 이들에게 스포가 되기 때문에 기재하지 않았다). 이 경험을 책으로 출판시키려는 인물은 총 세 명이다. 사건의 전말을 처음부터 끝까지 모조리 목격한 유일한 딘, 간접적인 피해를 입었던 켄드라(손지윤 분), 그리고 글로리아의 존재 자체도 모르고 있었던 낸(임문희 분).
세 명은 제각각 자신의 트라우마가 대중에게 보다 설득력 있는 것이라 여기며 책 출판에 심혈을 기울인다. 사건을 현장에서 목격한 딘은 이 경험이 오로지 자신만의 것이라 주장하며, 켄드라는 동료들의 입장에서 사건의 상황을 재구성하고자 한다. 한편, 이 사건과 그리고 글로리아와 아무 관련도 없어 보이는 낸은 사건이 일어나던 순간, 자신이라는 존재와 그의 삶을 되돌아보며 새 생명을 느꼈다고 말한다.
 | ||
끔찍한 경험, 그것은 실재하는 것이었다. 그들이 겪은 트라우마와 갖가지의 고통도 마찬가지다. 더불어 이 사건으로 인해 그들(딘, 켄드라, 낸)의 삶이 변했다는 것도 사실이다. 그러나 이 실존하는 모든 것들은 결국 자본의 수단으로 전락해버리고 만다. 이 모습을 마치 원테이크 영상 한 편으로 담아내며, 아니, 조물주가 인간을 바라보는 시선으로 그들의 속마음을 낱낱이 직면하게 되며, 관객들은 인간이라는 존재의 저열한 구석을 만나야만 했다.
글로리아라는 사람은 많은 사람들의 눈과 귀와 입에 의해 각색되어졌고, 아주 평범하고 조용하던 그녀의 실체는 왜곡이 불가피해졌다. 실제 사건을 경험했던 기억이, 본인의 현재 상황과 판단에 맞게 다양한 모습으로 재단되는 것이다. 결국 이 스토리의 뼈대와는 아무 상관도 없어 보였던 로린(정원조 분)은 극 전반을 관통하는 날카로운 말을 읊조린다. "웃기지 않아요? 이런 데가 다 좀 똑같은 게? 사람까지 다 똑같아요. 왜 그럴까요?"
 | ||
연극은 세 무대를 보여준다. 글로리아가 다니던 잡지사 사무실, 스타벅스, 글로리아 이야기를 드라마로 만들려는 한 제작사 사무실. 그에 따라 배우들도 1인 다역을 소화해내고 있었다. 그러나 장소는 변했지만 모습은 변하지 않았고, 역할은 변했지만 사람은 변하지 않았다. 로린은 작가의 목소리를 가장 진하고 깊게 담아내고 있는 인물이다. 그는 "난 그냥 좀 더 존재하고 싶다"고 말한다.
 | ||
존재하는 것 그 자체. 사람들은 하나의 실재에 대해 제각각의 의미를 부여하고, 그 의미를 제 입맛에 맞게 변질시키고, 심지어는 그 실재를 허구로도 만들어버릴 수 있다. 연극 '글로리아'가 명확하게 발견한 인간의 표상은 이런 성질의 것이었고, 이 세계를 지켜본 관객으로서 그리고 실제 세계를 살아가고 있는 한 존재로서 그 표상을 부인할 수 없다.
120여 분의 시간 동안 관객들을 한 사건의 목격자로, 또한 생존자들의 실오라기 하나 걸치지 않은 욕심의 나체를 마주한 관찰자로 만든 연극 '글로리아'는 오는 28일까지 두산아트센터 Space111에서 공연된다.
[글] 문화뉴스 장기영 기자 key000@mhns.co.kr
[사진] 노네임씨어터컴퍼니
- [문화리뷰] 빠져들 수밖에 없는 달콤한 미끼 같은 음악, 어반 팝 듀오 '치즈(Cheeze)' 단독공연 '무드 인디고'
- [문화's 픽업] 손예진 주연의 '덕혜옹주', 연극으로도 만들어진다
- 철학자 강신주, '헬로 아티스트' 展 오디오 해설자 참여
- [문화리뷰] 뮤지컬 '잭더리퍼'…스릴러, 로맨스, 코믹이 잘 버무려지다
- [문화리뷰] 잘 오려낸 소설 한 조각…뮤지컬 '카라마조프'
- [문화리뷰] 닳고 닳은 그 이름, 몰라주는 게 미안하지 않았던 그들, 아버지와 어머니
- 뮤지컬 '그날들'의 주연들이 사진으로 전하는 20년 초월의 브로맨스
- [문화리뷰] "엄마와 예술가, 양립할 수 있을까?"…예술가의 일상이 '예술'이 되는 자리
- "잠수하고 있는 당신, 지금 괜찮은가?"…연극 '잠수' 개막
- [문화 生] 오바마, 싸이, 박태환을 만나고 싶다면?…'그레뱅 뮤지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