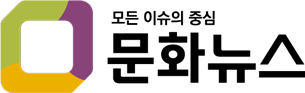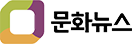우리의 삶을 돌아보고 진정한 내일을 찾아야 할 때
리얼리즘의 화가가 전하는 자기 성찰적 '삶'

[문화뉴스 김창일 기자] 국립현대미술관 서울에서 국내 리얼리즘 대표 화가인 황재형 작가의 ‘회천回天’전이 열리고 있다. 황재형(1952~)은 1980년대 초반 강원도에 정착해 광부로 일한 경험을 리얼리즘 시각으로 그려낸 ‘광부화가’로 잘 알려져 있다. 1980년대 이후 현재까지 ‘광부화가’의 정체성 안에서 황재형의 예술적 성취를 조망하는 전시회를 찾아가 보았다.
'회천(回天)’
하늘을 돌리고, 진정한 삶을 찾아야 할 때

1부 ‘광부와 화가’는 1980년대부터 2000년대까지 그려낸 탄광촌의 노동자와 주변인의 인물 초상이 중심을 이룬다. 중앙대 재학 시절부터 그린 <징후>(1980), <황지330>(1981)을 비롯하여 3년간 광부로 일한 경험을 바탕으로 제작한 <목욕(씻을 수 없는)>(1983), <식사>(1985) 등을 선보인다.
또, 1980년대 중반 이후 탄광촌의 폐품을 오브제로 사용하거나 철망이나 비정형의 합판을 캔버스로 활용한 작품들도 확인할 수 있다. 이 외에 1990년대 이후 탄광촌에서의 경험을 반추하며 제작한 작품들도 함께 소개한다.

2부 ‘태백에서 동해로’는 황재형이 1980년대 중반 광부를 그만두고, 1989년 시행된 석탄산업 합리화 정책에 따라 폐광이 늘어나는 상황을 목도하면서 관조자로서 삶의 터전을 바라보는 1990년대 이후 시기를 담고 있다.
탄광촌뿐 아니라 강원도의 대자연을 그린 풍경화로 구성된 2부에서는 작가의 신체와 현장 사이의 거리가 다시 멀어지면서 생겨나는 시야의 확장을 보여준다. 석탄가루와 오물이 흐르는 탄천 위로 노을이 지는 풍경을 그린 <작은 탄천의 노을>(2008), 폭 5m에 달하는 <백두대간>(1993~2004) 등을 선보인다.


3부 ‘실재의 얼굴’은 2010년대 황재형이 지역을 벗어나 초역사적 풍경과 보편적인 인물상을 그리고, 1980년대에 천착했던 주제를 머리카락을 이용해 새롭게 풀어내는 시기를 담고 있다. 화면에는 탄광촌의 광부와 주변 풍경이 재등장하는 한편 세월호나 국정농단 사건과 같은 동시대 이슈들이 나타나기도 한다.
은퇴한 광부를 극사실주의 기법으로 그린 <아버지의 자리>(2011~2013), 유화로 그린 광부의 초상을 머리카락으로 새롭게 작업한 <드러난 얼굴>(2017), 흑연으로 역사의 시간성을 표현한 <알혼섬>(2016) 등이 공개된다.

윤범모 국립현대미술관장은 “광부화가 황재형이 그려낸 사실적 인물과 광활한 대자연, 초역사적 풍경은 오늘의 우리에게 큰 울림을 준다”며,
“《황재형: 회천回天》은 지난 40년 동안 사실적인 묘사를 바탕으로 현실의 본질에 다가가고자 한 그의 발자취를 되짚어보고 한국 리얼리즘의 진면목과 함께 미술사적 가치를 재조명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 사람이 왜 이걸 그렸을까?’하는 질문과 답을 구하는 감상이 되었으면 한다.
작품을 감상할 때, ‘일반적인 관점’과 ‘예술에 대한 성취적 관점’ 두가지가 있다. 우리도 이젠 예술의 성취를 볼 수 있는 눈이 있어야 한다.
작품을 감상할 때, 시각적인 관점에서 머물지 않고 인간의 사유 속에서 벌어지는 예술에 대한 성취 즉, ‘이 사람이 왜 이걸 그렸을까?’하는 질문과 답을 구하는 감상이 됐으면 한다.
‘회천’이라는 건 물리적인 혁명이 아니라 가치관의 전복혁〮명이다. 대량생산 체제에 빠져들어 허망하게 끝이 나면 돌이킬 수 없게 된다. 임계점까지 도달하면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 없게 된다.
이대로 방치하면 거기까지 갈 수 있다. 우리는 발전만 할 것이라고 생각했지만, 코로나19가 (갑작스럽게 찾아와) 우리를 힘들게 하고 있다. 무력감, 무능감에서 벗어나 자율적인 삶을 찾아가야 하지 않겠나?
물질적인 것들, 돈의 단위가 행복을 주지는 않는다. 우리가 어디에서 있고, 어디로 가고 있는지를 봐야 한다.
‘회천’은 하늘을 돌리는 것이며, 진정한 것으로 가자는 것이다. 지금 우리 세대는 이렇게 가지만, 젊은 세대는 이렇게 살지 말아야 한다.
- 황재형 작가, 개인전 ‘회천回天’ 8월 22일까지 국립현대미술관에서 열려
- 국립현대미술관 가족과 함께 야외에서 미술품 감상하는 ‘숨은 작품 찾기’ 운영
- 국립현대미술관, 과천 어린이미술관 확장 개편으로 가족 관람객 손짓
- 국립현대미술관이 품은 ‘이건희 미술소장품’ 주요 작품 살피기… 박수근, 고갱, 모네, 샤갈 등
- [김기자의 직관 리뷰] ‘거울은 먼저 웃지 않는다’···석파정 서울미술관 ‘거울 속의 거울’ 展
- 아트부산 2021 특별전, 낯선 현대미술과의 첫 만남
- 사진으로 바라보는 코로나19 일상···'거리의 기술' 사진전
- 5월의 전시, 김건주 'Portraits of a Day'
- 국립현대미술관 온라인 공연 'MMCA 라이브 X 나태주·루시드폴·요조', 오는 11일 공개
- 수원시립미술관, 문화예술프로젝트 '거대한 안,녕' 열려
- [전시] 동시대의 현실을 집약한 ‘재난과 치유’ 展
- [Fun 喜·직관 리뷰]이지은 작가 개인전 'FOCUS 포커스展'···작가의 상상력을 더한 영화 속 장면
- [김기자의 직관 리뷰] ‘한국의 미’를 찾는 ‘DNA : 한국미술의 어제와 오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