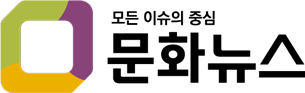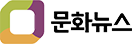대답하는 상대가 결론을 내리는 방식이 궁금할 뿐이다.
이런 유형의 질문에는 항상 정답을 바라지 않는다.
오스트리아 여행에서 나눈 대화가 기억에 남는다. 전시회를 보러 갔다. 환경운동가이자 예술가인 훈데르트바서(Friedensreich Regentag Dunkelbunt Hundertwasser)의 전시회다. 환경에 대한 메시지가 있었다. 바람은 형체가 없지만 거의 모든 걸 전달한다. 바람을 볼 수 있게 했다. 비닐에 담아서 보여줬다. 그 예술작품은 신선했다.

친구들에게 물었다. “테슬라가 환경을 생각하는 기업이라고 생각하니?” 부정적인 대답이 돌아왔다. 지구를 구하고 새로운 땅을 개척하겠다는 말은 허구라는 것이다. 테슬라가 원하는 것은 돈이지 좋은 환경이 아니다. 이런 의견이었다. 전기차를 만드는 과정에서 많은 양의 탄소를 배출하게 된다는 말도 덧붙였다. 친구들은 테슬라에 대해 부정적인 생각들을 가지고 있었다.


빈에 위치한 유엔본부에 갔다. 가이드는 다양한 내용을 설명해줬다. 지금까지 진행된 핵 실험의 횟수, 모든 건물이 햇빛을 받을 수 있도록 설계되는 과정, 빈에 유엔본부가 설치된 이유 같은 이야기였다. 내 눈에 먼저 들어온 것은 그의 흰머리였다. 수 많은 복지와 훌륭한 시설을 지원받으며 일하고 있을 텐데도, 이곳에서 일하는 것은 스트레스받는 일일까. 생각했다.
I는 알바니아에서 온 친구다. 이 친구와 함께 여행을 마무리했다. I에게 질문했다. “외계인이 존재한다고 생각하니?” “신이 존재한다고 생각하니?” “인류에게 희망이 있다고 생각하니?” 이런 유형의 질문에는 항상 정답을 바라지 않는다. 대답하는 상대가 결론을 내리는 방식이 궁금할 뿐이다. 이런 질문을 던질 때마다 각자 다른 대답이 나온다는 사실이 흥미롭다.
정치 이야기도 했다. 한국의 정치 지형과 페미니즘에 관해서 이야기했다. 알바니아는 수십 년간 공산주의 아래 있던 탓에 나라가 가난하다고 했다. 여성할당제에 반대한다고 했다. 여성이 성별 기반이 아니라 능력 기반으로 고용되는 것이 정의롭다고 했다. 여성할당제에 반대한다고 해서 안티 페미니스트가 되는 것이 아니라고 했다. 그 상황과 맥락을 살펴야 한다고 했다.
J와 K는 프랑스에서 온 친구들이다. 그들은 나를 체계적인(organized) 사람이라고 했다. 나에게 질문을 할 때면 나는 긴 설명을 했다. 예산을 짜는 것은 생각보다 어렵지 않다. 구글 스프레드시트를 사용하고 있다. 일기는 의식의 기록이다. 나의 모든 부분들을 뇌 안에 저장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그러나 아이패드에는 저장할 수 있다. 이런 설명들 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