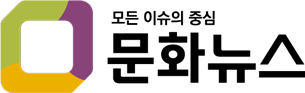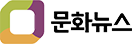| ||
[문화가 있는 날·예술이 있는 삶을 빛냅니다…문화뉴스] 수많은 연극들은 '메시지'를 던진다. 아니, 연극이라는 장르 뿐 아니라, 숱한 소설과 영화들도 작품의 수용자를 향해 메시지 던지기에 주저하지 않는다. 더불어 관객(혹은 독자)들은 던져진 메시지를 받아내는 것이 낯설지 않다.
메시지라는 것은 특정한 의미나 의도를 함축하고 있다. 그렇다면 기존의 연극과 소설, 영화와 같은 예술 작품들은 특정한 의미나 의도가 함축되어 저자만의 형식으로 발화를 실현하고 있는 것들일 테다.
 | ||
하지만, 도저히 메시지를 찾을 수 없었다. 메시지 받는 것에 익숙해져있던 우리에게 연극 '잠자는 변신의 카프카'는 쉽사리 메시지를 허락하지 않는다. 김현탁 연출가는 프란츠 카프카의 '변신'이란 원작을 해체해 대략의 예상들을 무너뜨리고 색다르게 재구성했다. 무대에서 펼쳐진 퍼포먼스와 드라마의 해체적 재구성은 의미를 하나하나 파헤쳐야 할 대상들이 아니었다. 의미를 되새기며 곱씹어볼 연극이 아니라, '덧입힐' 연극이었던 것이다.
'벌레 같다'는 말은 소외감과 무기력함, 혐오감이라는 느낌과 긴밀한 인간을 향한 직유(直喩)적 표현이다. 카프카는 이런 직유에서 '유(喩, 비유)'를 제거하고, 비유로만 가능할 것 같은 사건을 현실로 만들어버린다. 그는 그레고르 잠자가 벌레가 된다는 초현실적인 사건을 설정하고, 이후부터는 아주 사실적이고 실제적인 표현을 유감없이 발휘한다. 김현탁 연출가는 이런 작품을 해체한다. 그리고 '잠자'에게 그레고르 잠자와 프란츠 카프카, 그리고 현대의 김현탁을 동시에 투영시킨다.
 | ||
'덧입혀야할 연극'이라는 표현은 여기서 비롯된다. 이미 원작을 익히 알고 있는 관객들은 프란츠 카프카의 '변신'이 김현탁과 극단 성북동비둘기를 통해 어떤 식으로 각색되고 재구성 됐을까에 대해 궁금해 하며, 그들이 새로이 부여했을 '의미'들에 초점을 맞춘다. 그러나 연극은 의미를 해석하기보다는 우리의 상상을 덧입히길 원하는 듯하다.
 | ||
"무대에서 잠자가 벌레로 변하는 것은 가장 해서는 안 되는 짓이라고 생각했어요. 배우가 아무리 벌레로 변신해도 '쟤는 사람이야'라고 하지, 벌레로 보기 힘들잖아요."
그는 영리한 연출가였다. 배우를 통해 벌레를 어떻게 형상화 했을까에 대한 관객들의 뻔한 예측들에서 빠져나와, 잠자와 카프카, 그리고 김현탁 사이의 아예 새로운 '변신'을 꾀한 것이다. 마치 소설 같은 연극이었다. 소설은 텍스트의 범람 속에서 독자들의 자유롭고 기발한 상상력이 무한히 헤엄칠 수 있는 시공간을 허락한다. 반면, 연극이란 시간과 공간 모두가 한정된 틀 안에서 진행되기 때문에 상상력을 쉽사리 허락하지 않는다. 게다가 배우와 연기, 무대라는 요소를 통해 반드시 '시각화'라는 부분을 충족시켜야 하기 때문에, 관객들 저마다의 상상력이 날개를 펼치기에는 무리가 있다.
코올리지는 나무를 표현하기 위해 실제 나무를 무대 위에 직접 제시하는 게 아니라, 무언가를 나무로 관객들이 믿도록 만들어내는 예술이 연극이라고 말한 바 있다. 김현탁은 관객들에게 벌레 모사 혹은 모형을 통해 텍스트에 대한 이해력을 보다 쉽게 돕고자 하기는커녕, 벌레 그레고르와 배우 신현진의 사이에서 관객 개개만이 해낼 수 있는 상상력을 이끌어낸다. 그리고 그들의 상상은 거기서 멈추는 것이 아니라, 카프카와 김현탁이라는 인물과 자기 자신이라는 영역의 확대를 통해 비로소 확장된 상상력까지 이끌어내게 된다.
 | ||
"카프칸지 잠잔지 너만 보면 화가 난다! 우리들의 불행이 모두 네 탓이기 때문이다!"
연극 말미에 그레고르 잠자의 아버지는 외친다. 잠자를 향해 말이다. 우리의 불행의 근원은 네 존재 때문이라고 말이다. 가족들의 불행은 그랬다. 잠자 때문이었다. 잠자가 아무 일도 하지 못하고 밥만 축내는, 아주 혐오스러운 벌레가 되어버렸기 때문에 그들은 더 이상 편안하고 안락한 삶을 누리지 못했다. 그러나 이내 그들은 스스로 살 길을 찾아 아주 독립적인 사람들이 되어 갔다.
그리고 우리의 불행도 카프카 때문이 맞았다. '변신'을 창작한 카프카가 없었더라면, 사람이 벌레가 되어버렸다는 그런 말도 안 되는 소설이 있지 않았더라면, 우리에게 벌레는 혐오감의 존재일 수밖에 없었기 때문이다. '일하지 않는 자 먹지도 말라'는 철저한 자본주의적 논리에 종속되어가던, 아니, 잠식이라는 표현이 맞겠다. 잠식되어가던 인간들에게 벌레처럼 살고 싶다는 혐오스럽고 은밀했던 소망을 실존의 것으로 만들어냈기 때문에, 우리의 조심스러웠던 불행이 '불행이 맞다'는 사실을 자각할 수 있게 되었다. 기존의 인식들을 불편하게 만드는 것, 우리는 그것을 불행이라 생각한다.
그리고 나는 생각한다. 당분간 얼마간은 김현탁이라는 존재도 연극계의 불행이 되지는 않을까, 하고 말이다.
문화뉴스 장기영 기자 key000@mhn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