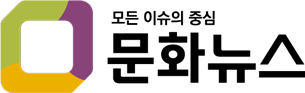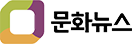연극 '키 큰 세 여자' 리뷰
[문화가 있는 날·예술이 있는 삶을 빛냅니다…문화뉴스]
 | ||
"어떻게 저럴 수 있지?"
'젊음'은 각박하다. 인생에 대해 엄격하며, 자신에 대해 몰인정하다. 불과 몇 년 전만 해도 이해할 수 없는 사건과 행실들이 있었다. 그러나 얼마 지나지 않아, 절대 이해할 수 없을 것만 같던, 내 삶에 있어서 절대 불가능이라는 영역에 속했던 일들을 '가능할 수 있다'며 시인하게 된다. 그렇게 우리는 이해할 수 있는 것이 점차 많아지고, 스스로를 옥죄었던 결박들을 느슨하게 만들며 인생을 알아간다.
연극 '키 큰 세 여자'의 26살의 여자 C도 여지없이 소리친다. "난 저렇게는 안 될 거예요", "난 당신이 되지 않을 거예요"라고 말이다. 젊음은 늙음을 거부한다. 젊음이 미래를 부인하는 것이다.
 | ||
연극 '키 큰 세 여자'에는 키가 큰 세 여자가 등장한다. 90대의 부유한 할머니 A, 50대 간병인 B, 20대 변호사 사무실 직원 C. 1부에서 그들은 각자 제 삶을 얘기한다. A가 젊었던 시절을 회상하는 가운데, C는 A의 말 한 마디 한 마디가 이해가지 않아 자꾸만 말꼬리를 잡고 늘어진다. C는 A의 말들의 맥락을 이해하지 못하며 자꾸만 하나하나 되짚으려 했고, A는 C의 태도 자체를 이해하지 못해 분개한다. 그리고 B는 A와 C의 사이에서, A를 어르며, C를 타이른다. 1부만 놓고 본다면, 작품은 이해할 수 없는 세대 간의 간극을 사실적으로 표현하는 작품이었다.
그러나 2부로 들어서자, 걷잡을 수 없이 매력적인 작품으로 변모한다. 20대 여성과 50대 여성이, 90대 할머니 인생의 한 부분을 담당하면서 말이다. 각자 제 나이에 맞는 화려한 드레스를 입고 나와 자신이 살아가고 있는 삶의 순간들을 생생하게 이야기하는데, 20대는 통통 튀는 매력으로 삶의 생동성과 설렘을 관객들에게 고스란히 전해준다. 특히나 첫 '경험'의 순간을 이야기하며 부끄러운 듯이, 그러나 반짝거리며 경험담을 내뱉을 때는 자신의 나이와 꼭 들어맞는 매력을 남김없이 보여준다.
 | ||
"지금이 가장 행복한 순간이야. 산으로 치면 지금은 꼭대기에 머무른 셈이지."
50대 여인은 관조적이다. 인생의 절반을 겪어온 그녀는, 자신이 살아온 만큼 다시 살아갈 날을 남겨두는 자세로 자신이 가장 행복하다고 얘기한다. 더불어 20대일 때에는 상상조차 해볼 수 없었던 일들을 경험담으로 나지막이 내뱉는데, 20대는 그녀를 이해할 수 없다. 아니, 이해하기 힘들다.
"난 지금 마지막 순간에 있어. 나 자신을 제 3자의 입장에서 볼 수 있지."
"죽음을 안다는 것과 내가 죽을 줄 안다는 것은 매우 다른 일이야."
90대는 죽음과 너무나도 가깝다. 삶을 이야기하는 20대와 50대와는 달리, 그녀는 이제 '죽음'을 이야기한다. 죽어가는 자신과 죽음의 순간에 처했던 상황을 말이다.
 | ||
1부에서는 자꾸만 피식 피식 웃음이 났다. 대화가 굉장히 실제적이고 구체적이어서 나의 실재적인 지난 상황들이 떠올랐던 것이다. 그러나 2부에서는 이유 모를 눈물들이 쉴 새 없이 얼굴을 뒤덮었다. 생애 최초로 배우들의 연기가 얼마나 대단한 것인지를 유감없이 알려주는 무대를 만났던 것은 아닐까, 그 이유를 짐작해본다.
특히나 배우 박정자는 90대 할머니의 역할을 맡아 1부에서는 조잘조잘 쉬지 않고 과거를 이야기했고, 2부에서는 죽음을 이야기했다. 그녀는 1부와는 전혀 다르게, 2부에서 중후한 목소리로 삶의 마지막을 고백하고 있었다. 세 명의 키 큰 여자가 여실히 보여주는 한 여인의 일생은, 여성 관객들로 하여금 자신이 '여자'라는 사실만으로도 벅차오르는 감격과 알 수 없는 서러운 일생에의 온전히 공감하게끔 만든다.
 | ||
배우 박정자는 가장 행복할 수 없을 것만 같던 마지막의 순간을 가장 행복하다고 말한다. 쉽사리 인정할 수 없는 말임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박정자라는 배우가 "가장 행복한 순간은, 다 끝나는 순간"이라고 말함으로 인해 그 사실을 인정할 수밖에 없게 된다. 그녀가 연기하는 삶의 마지막은, 태어나면서부터 죽음을 향해 달려가는 인간이라는 존재들이 그 사실을 망각하며 살고 있음을 자각하게 해준다. 망각 속에 빠져 허우적대고 있었던 우리 현재의 모습이, 그녀로 인해 '제 3자'의 입장에서 보인 것이다.
행복했다, 연극 '키 큰 세 여자'를 만날 수 있어서. 한 생애에 있어, 눈물로 뒤범벅이 될 수 있는 작품을 만날 수 있는 때가 얼마나 될까 싶다. 과거와 겪고, 현재를 사는 존재로서 감격과 공감의 시공간, 혹은 앞으로 미래를 알지 못하는 존재로서 다가올 미래에 대한 두려움과 공경의 시공간이 교차되었다. 그리고 이 교차 지점에서 자신의 삶을 타자화(他者化)시켜, 인간이라는 존재가 최종적 도달로 향해가며 어떤 삶을 그리게 되는지 지켜보는 순간을 허락받게 된다. 더구나 이 순간은 오로지 연기로만 가득 메워진 이 무대에서만이 오롯하게 실현될 수 있었던 것이고 말이다.
문화뉴스 장기영 기자 key000@mhn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