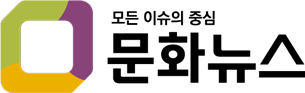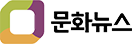연극 '토막' 리뷰
 | ||
[문화가 있는 날·예술이 있는 삶을 빛냅니다…문화뉴스] "이것이 우리 현실이다!"
1933년 소공동 공회당, 관객들은 공연이 끝난 후 울부짖으며 이렇게 외쳤다. 그리고 2015년의 국립극장 별오름극장에서 마음으로써, 그리고 글로써 나 또한 외친다. "이것이 지금의 우리 현실과 다름없다"라고 말이다. 1930년대 동랑 유치진 선생이 처음으로 쓴 희곡 '토막(土幕)'은 2015년에 와서 연출가 김철리와 국립극단에 의해 다시 태어났는데, 어찌나 현실적인지 현재 우리의 현실과 따로 생각할 수 없을 정도로 긴밀하다.
'토막'이란 땅을 파고 위에 거적 따위를 얹고 흙을 덮어 추위나 비바람만 가릴 정도로 임시로 지은 움막집을 가리킨다. 삶의 터전이자, 삶의 전부였던 '토막'은 당시 민초들의 현실들을 적나라하게 드러내는 공간이다. 그러나 무대에서 토막의 모습은 사실적으로 묘사되지 않았다. 움막집을 덮는 거적도 없으며, 문간이나 방의 구분도 없었다. 무대 위에 솟은 세 바닥이 곧 명서네가 사는 토막의 전부였다. 누추한 세간을 구체적인 오브제로 표현하는 대신, 배우들의 연기를 통해 궁핍하고 비참한 현실을 표현해낸 것이다.
 | ||
"죽어라고 일을 해도 입에는 거미줄 쳐지는 세상이어유. 장가가 다 뭐예유"라고 말하는 삼조는 마치 우리 시대의 삼포세대(연애와 결혼, 출산을 포기한 청년 세대를 일컫는 말)로서의 청년들을 대변해주고 있는 듯했다. 더 이상 이곳에서 살아갈 재간이 없음을 직시한 삼조는 일본으로 향한다. 양복과 구두로 반짝반짝 멋을 낸 삼조는 가죽가방을 들쳐 매고 사라지는데, 그는 이후로 무대에 다시는 등장하지 않는다. 희망이 없는 고향 땅을 등지고 떠나가는 젊은이들을 향해 명서는 이렇게 외친다. "젊은 너희들은 메뚜기 마냥 가고픈 대로 뛰어가니, 여(기)는 늙은이와 병신뿐이로구나".
 | ||
1930년대에 창작된 '토막'이 2015년에 와서도 여전히 현실적인 이유는 무엇일까. 연극이 다른 특별하고 훌륭한 누군가의 업적이 아닌, 비참한 일상의 민초들을 비추고 있기 때문이다. 장리쌀 몇 가마니를 갚지 못해 재산 전부를 빼앗기는 경선, 돈을 벌러 간 아들을 기다리는 늙고 병든 명서네 가족, 조국에서는 살아갈 희망을 찾지 못하고 일본으로 떠나는 삼조, 하루 종일 닭 꽁무니만 좇는 이웃여자. 당시의 민초들을 보며 우리의 모습이 곧바로 떠올랐다는 점은, 너무나도 가슴 아픈 사실이다. 더구나 이들의 모습은 자꾸만 집달리(양복쟁이)와 한복여인, 그리고 양장여인과 대조됐다. 그들은 처참한 고통을 겪어내는 민초들과는 전혀 다른 세계인 벽면 뒤에서 유흥을 즐겼다. 또한 밤새 술 퍼마시고는 토악질을 하며, 노래를 흥얼거린다. '산타루치아'부터 '가을엔 편지를 하겠어요'까지.
 | ||
명수의 행방을 알게 된 식구들의 마지막 절규가 아직까지도 귓가에 맴돈다.
"명수야, 애지중지 내 자식아!"
"이 토막에서 자란 너는 우리 품에 돌아왔구나."
"나는 개돼지처럼 살면서 한 마디 불평도 없이 꾸역꾸역 일만한 사람이여.
무엇 때문에 내 자식이 이런 지경이 되었느냐. 육시랄 놈들아!"
유치진은 이 작품에 대해 "병들고 가난해서 서럽기만 한 우리 현실을 가식 없이 묘사해보겠다는 생각으로 기록하듯이 쓴 것이다. 작가는 자기 시대의 모순을 지적해야 한다"고 말한 바 있다. 그의 처녀작이라 그런지, 그의 의도는 유감없이 드러났다. 극은 가감이 없었다. 있는 그대로 묘사했으며, 우리 평범한 일상의 한 단면을 적나라하게 보여줬다.
 | ||
희망이 부재한 연극이었지만, 이 연극 자체가 절망스럽거나 불쾌하지는 않았다. 바로 '민초'라는 존재 때문이다. 딱히 특별한 대안도 없고, 해결책도 없는 삶이고 현실인 것은 달라지지 않는다. 그러나 주저앉아 넋을 놓으며 울고 있는 부모세대 민초에게, 자녀세대 민초인 금녀는 이렇게 말한다. "서러워 말구 살아가세유. 오빠는 우릴 져버리지 않아유. 죽은 혼이라도 살아 우릴 지켜줄 거예유."라고 말이다.
한 세대의 절망이 반드시 다음 세대의 절망으로까지 이어지기만 할까? 이어지기도 한다. 그리고 절망을 지독하게 겪어보지 못한 젊은 민초들은 절망도 끈질길 수 있다는 점을 간과할 수 있다. 그러나 젊음이기에 그 끈질김도 간과할 수 있다. 이것은 결국 세대를 넘어 절망을 극복해내고자 하는 움직임으로 이뤄지기도 한다. 지금껏 민초들이 버틸 수 있었던 데에도, 이런 젊은 민초들의 무모함이 새록새록 피어났기 때문은 아니었는가.
시인 김수영은 말한다. 풀은 "바람보다 늦게 누워도 먼저 일어나고, 바람보다 늦게 울어도 먼저 웃는다"고 말이다. 우리는 '민초'다. 민중을 질긴 생명력을 가진 잡초에 비유한 단어로서의 민초. 이것은 여전히 처참한 현실을 살아내는 우리들이 스스로의 정체성을 되돌아볼 때, 가장 먼저 되새겨야 할 본질은 아닐까.
문화뉴스 장기영 key000@mhns.co.kr